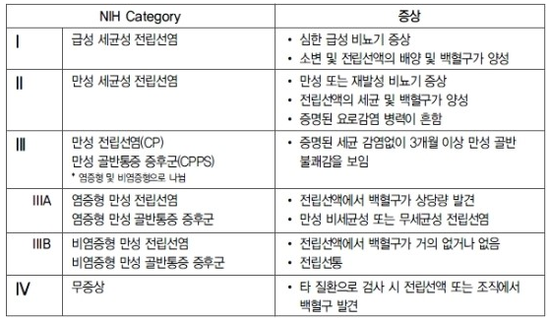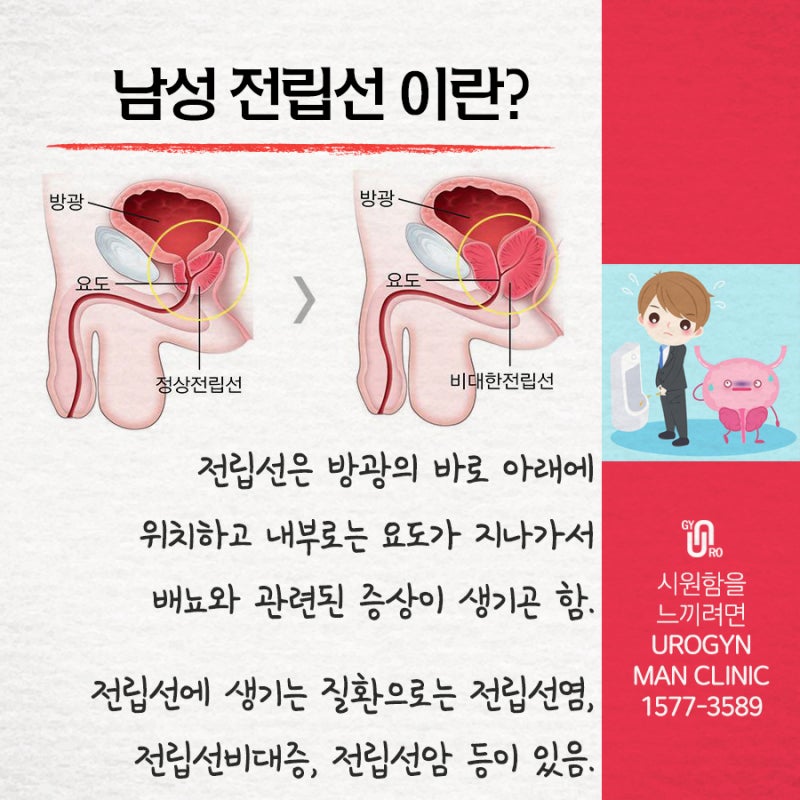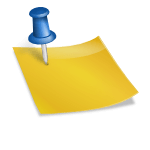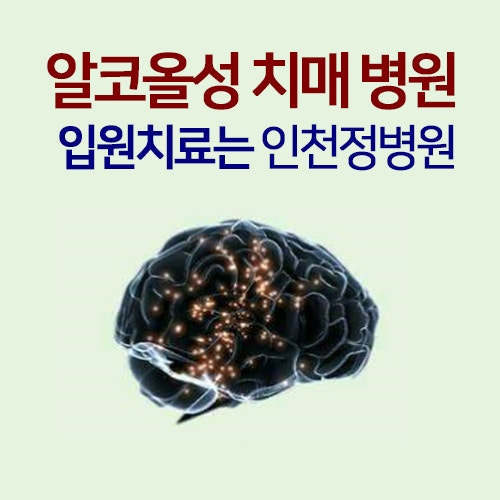<Part I에서는 간략하게 전립선염의 정의와 원인 인자는 살펴보았고, 본 Part II에서는 치료적인 문제는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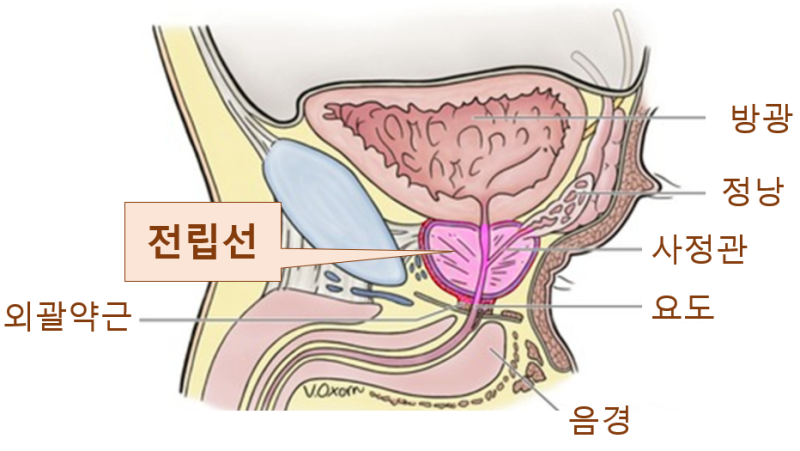
기본적인 약물 치료 지침-알파 차단제(통상 전립샘 비대증 약으로 알려진 약입니다.-하루 및 프리 버스, 트루 패스, 쟈토랄, 하이트 린, 카도우ー라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은 하부 요로 증상(소변 속 감소 및 소변 기둥 밑바닥 잔뇨감 등)의 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료 개시 4~6주 내에 하부 요로 증상이 없어지지 않거나 기타의 증상이 완화되지 못하는 경우는 알파 차단제를 중단하고 다른 약물 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항생 물질은 전체적인 증상, 요로 증상, 통증 및 생활의 질의 면의 호전에서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치료 선택 사항으로 고려합니다. 항생제는 약물 상호 작용 및 금기 사항을 고려해서 처방할 필요가 있으며, 세균 배양 결과가 있으면 감수성 검사 결과에 의해서 선택합니다.-통상 4~6주 키노롱(예:ciprofloxacin, levofloxacin, tosufloxacin)이 한차 요법으로 권장됩니다. 세균성 원인이 확인되거나 환자가 최초의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는 경우에만,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 과정(4~6주)이 필요합니다.-다양한 약제에 의한 복합 요법은 각 환자마다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일차 요법으로 권장되는 약제는 항생제, 알파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S), 신경병증성 진통제(예:pregabalin)또는 5알화레닥타ー제 차단제(주로 하부 요로 증상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입니다. 이런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약물 치료에는 옵션이 수십가지 있습니다. 각각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추어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죠. 통증 관리 지침-보통 환자의 경우 통증 관리 때문에 acetaminophen(토라 마 도리, 울트라 세트, 타이레놀 등)을 주축으로 진통제의 규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진통제(NSAIDS)은 염증 과정에 따른 것으로 의심 증상을 경험했다고 판단되는 초기 환자에게 단기 통증의 치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증상이 감소하지 않으면 치료 개시 후 4~6주 이내에 NSAIDS는 중단해야 합니다.-통증이 신경병증으로 간주될 경우 Gabapentin(예:pregabalinorgabapentin)등의 신경통 약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쓰기보다는 일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악화될 때 추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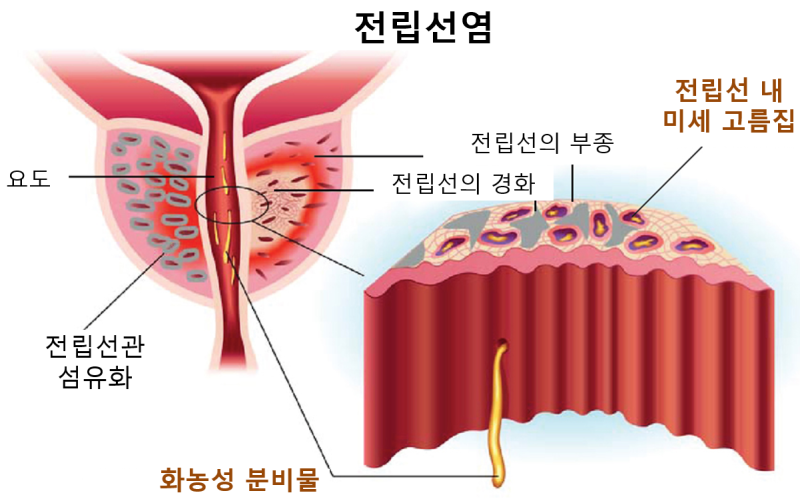
항생제 치료의 기본 원칙-용어의 정의 및 의미를 보자 비밀 세균성 전립선염(nonbacterial prostatitis, NBP)또는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CPPS)는 세균 감염이 주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는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CPPS)치료에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의사는 환자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장기간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라 세보 효과도 50%에 이릅니다. -이것은 환자의 절반은 그 약이 무엇이든 무언가를 처방할 때의 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비뇨기과 의사의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CPPS입니다. 결론-내가 이것 저것 뒤로 하여 이해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전립선염은 확실히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생약 성분이나 민간 요법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전립선염(Prostatitis)이라는 부적절한 명칭으로 CPPS는 환자도 의사도 치료가 어렵지만 알려지지 않은 감염이 있게 생각하게 되어 항생제를 써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줬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잘못된 인식은 쉽게 바꾸긴 하지만 환자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물리 치료나 통증 중심의 약물 요법을 대체하는 비뇨 의학과 의사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UROLOGY DIGEST vol. no.3(통권 3호), june